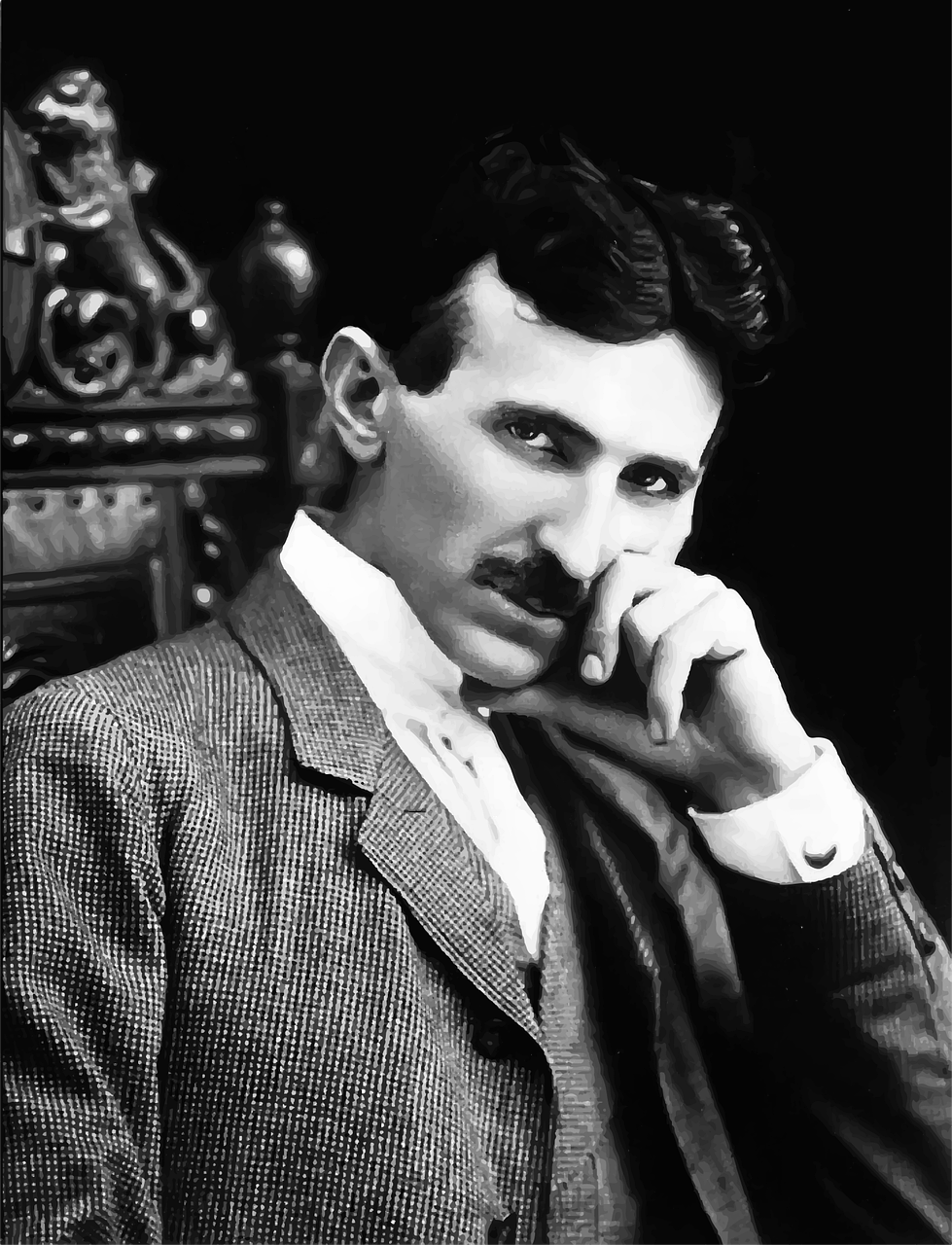티스토리 뷰
작가의 인터뷰는 그저 작품을 소개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인터뷰 속에는 작가의 생애, 철학, 그리고 글에 담긴 비하인드 스토리가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특히 스릴러 장르의 작가들은 작품만큼이나 흥미로운 삶과 사유를 지니고 있기에, 그들의 인터뷰는 또 하나의 ‘읽는 텍스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명 스릴러 작가들의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생애와 철학,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창작 비하인드를 들여다봅니다.
생애에서 시작된 이야기
훌륭한 스릴러 작가는 공통적으로 ‘파란만장한 생애’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이 직접 겪은 삶의 굴곡이 바로 이야기의 씨앗이 되며, 인터뷰에서는 그런 생애의 흔적들이 자주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스티븐 킹은 인터뷰에서 자신의 가난했던 어린 시절과 약물 중독 시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그는 “두려움을 마주한 순간들, 그것이 바로 내가 스릴러를 쓰는 이유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그의 작품들에는 고립, 중독, 가정 문제 같은 자전적인 요소가 자주 등장하며, 현실에서 우러나온 공포가 독자들에게 더 큰 몰입감을 줍니다. 정유정 작가는 간호사로 일하던 시절 겪은 환자들과의 경험이 인간의 생과 사에 대한 깊은 통찰로 이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죽음 앞에서 인간은 가장 본질적인 모습을 드러낸다”고 말하며, 그것이 스릴러라는 장르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설명합니다. 실제로 『28』이나 『7년의 밤』 같은 작품에서는 생존, 본능, 죄책감 같은 감정이 섬세하게 그려져 있죠. 도나 타트는 학창 시절부터 철학, 종교, 고전 문학에 심취해 있었다고 고백하며, “나는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삶을 해석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소설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이런 관점은 『비밀의 역사』라는 작품 속에서 도덕적 혼란과 인간의 양심을 주제로 풀어낸 배경이 됩니다.
철학이 만든 이야기의 골격
작가들이 인터뷰에서 가장 자주 언급하는 주제 중 하나는 ‘왜 이 이야기를 써야 했는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작가의 철학을 가장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며, 작품의 핵심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길리언 플린은 인터뷰에서 “나는 여성도 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소설에 담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기존의 여성 캐릭터가 수동적이거나 피해자로만 그려지는 것이 불편했다고 밝히며, 『나를 찾아줘(Gone Girl)』를 통해 복잡하고 다면적인 여성 인물을 창조했습니다. 이 철학은 곧 심리 스릴러의 트렌드를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죠. 히가시노 게이고는 “범죄는 인간의 내면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그의 철학은 단순히 사건 해결이 아닌, 왜 범죄가 발생했는가에 집중하며, 인간 본성과 도덕의 경계를 탐구합니다. 『용의자 X의 헌신』은 바로 그 철학을 가장 잘 담아낸 작품으로,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지는 비극을 서늘하게 그려냅니다. 정유정은 인터뷰에서 “나는 악인을 쓰지 않는다. 나는 인간을 쓸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녀의 철학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문장으로,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 대신, 인간 내부에 공존하는 감정들을 섬세하게 파고드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그 철학이 담긴 『종의 기원』은 독자들에게 “나는 선한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하며 강렬한 여운을 남깁니다.
비하인드, 인터뷰로 밝혀진 창작의 무대 뒤
스릴러 소설은 종종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에서 줄타기를 하며, 그로 인해 생겨나는 창작의 뒷이야기—즉 비하인드 스토리—는 작가 인터뷰에서야 비로소 드러납니다. 토머스 해리스는 『양들의 침묵』을 집필하기 위해 실제 FBI 요원과 함께 훈련소에 출입하며, 프로파일링 기법을 배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픽션은 설득력을 잃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노력이 있었기에 한니발 렉터 같은 캐릭터는 단순한 괴물이 아닌, 심리적으로 설득력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스티그 라르손은 『밀레니엄 시리즈』를 완성하기까지 오랜 시간 여성 인권, 성범죄, 부정부패 등을 취재하며 수천 건의 기사를 썼습니다. 그는 생전에 인터뷰에서 “내 소설은 픽션이라기보다 내가 세상에 하고 싶은 이야기의 또 다른 방식”이라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작품이 단순한 추리소설을 넘어 사회 고발서처럼 읽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유정 작가는 인터뷰를 통해 집필 전 철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고 여러 번 밝힌 바 있습니다. 『7년의 밤』을 쓰기 위해 실제 저수지를 방문하고, 심리학 서적과 프로파일링 보고서를 수십 권 읽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읽는 이가 현실처럼 느끼게 하려면, 나부터 그 상황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작가 인터뷰는 단순한 마케팅 도구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작가의 삶, 철학, 그리고 창작의 고뇌가 담겨 있습니다. 생애에서 비롯된 이야기, 철학으로 완성된 메시지, 그리고 무대 뒤에서 이뤄지는 치열한 고민까지—이 모든 것이 인터뷰 속에 고스란히 존재하죠. 진정한 독서란 책 한 권을 읽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작가의 말, 생각, 고백을 함께 읽어야 비로소 작품은 완성됩니다. 인터뷰는 곧 또 하나의 작품입니다.